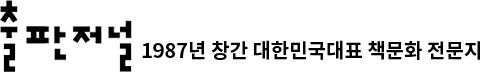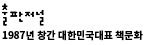서평
함께 살아있고 싶어서 쓰는 삼십 대 여자들의 이야기 <도시의 계절>
매일 퇴사하겠다고 주문 외는 직장인, 진짜로 퇴사하고 삶의 광명을 찾은 프리랜서, 논문 쓴다면서 매일 누워 있는 시간이 태반인 무기력한 대학원생, 가장 바쁘지만 실상은 가장 가난한 스타트업 대표. 진리, 예슬, 태인, 무해는 모두가 20대일 때 직장 동료로 만난 친구들이다. 퇴사의 이유도 그 다음의 길도 모두 달랐던 이들은, 모두가 30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함께 글을 쓰기로 한다.
살아있기 위해 쓴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네 여자 친구들에게, 함께 쓰는 일은 서로를 돌보는 일이었다. 무기력을, 우울을, 고독을, 언제든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삶의 불안을 견디며 우리가 따로 또 함께 손을 잡고 서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들은 답이 없는 질문 같은 삶을 함께 쓰며 풀어간다. 스물네 개의 절기는 끝과 맺음을 반복해 순환하며 이어진다. 그 순환에 기대어 이들의 글쓰기는 계속 이어지며, 삶 또한 다음으로 조금씩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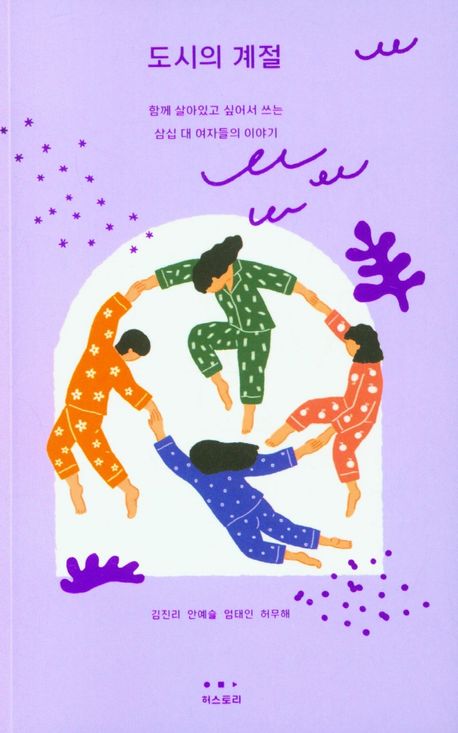
〈도시의 계절〉이 브런치에 연재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책의 편집자나 발행인이 아닌 독자로서 이 글들을 접했을 때. 그때는 떠오르지 않았던 의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왜 계절을 두고 글을 써? 책의 출간을 논의하기 위해 저자들과 모여 앉은 자리에서 물었다. 다들 ‘글쎄…’ 하는 분위기. 단 하나의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다들 20대일 때 누군가의 삶을 지원하는 조직에서 일하다 만난 이들 네 명의 면면을 보면, 절기든 계절이든, 이들이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흐름을 마감으로 글을 쓰게 된 건 퍽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함께 또 따로 살아가는 일을 고민하고, 자신의 진창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며, 친구의 삶을 어딘가에 고여 있도록 두고 보지만은 않는 이들. 거대한 정치적 구호만을 따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평등한 관계의 실천을 고민하는 이들. 살아 있기 위해 쓴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이들. 이들이 함께 글을 쓴다면 흘러가는 만물의 시간과 그 안에 서 있는 나와 우리의 삶을 사유하리라 생각했다.
입춘으로 시작하여 대한으로 마무리되는 이 책에는 끝과 시작이 있지만, 이들의 삶은 책 이전과 이후로 이어진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그 중 1년의 토막이다. 앞으로 뒤로 이어지는 시간들에는 최악이라 느끼는 날들도, 꽤나 괜찮은 날들도 다 있을 터. 절기에 1년 농사가 잘되라는 기원이 깃들어 있듯 ‘쓰기’는 그 모든 날들을 서로 기대어 살아 있기 위한 이들의 의식이다. 그리고 그 의식이 꽤나 괜찮은 일상의 주문이 아니겠냐고, 거기에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이들은 읽는 이들에게 제안한다.
이 책을 편집하며 낯선 곳을 여행했다. 낯선 곳에서, 일, 관계, 일상, 사회, 자신이 서 있는 시간과 자리에 관해 써내려간 글들을 읽었다. 흐르는 시간 속을 살아내기 위해 이곳과 저곳에서, 우리는 쓰고 있었고, 읽고 있었다. 이 책과 함께 나 또한 이들과의 관계와 책을 만드는 이들, 독자들과의 관계 속에 연루된다. 이번 계절은 지나가고 같은 이름의 계절이 또 돌아오지만, 지난 계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 않듯, 이 책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나는 결코 같지 않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절기의 뜻을 짚어보며 누군가와 함께 먹을 음식을 떠올리고, 다가올 계절을 채비하는 마음을 먹게 될까.
도서정보 : 김진리, 안예슬, 엄태인, 허무해 지음 | 허스토리 | 216쪽 | 값 17,800원
Copyright (c) 출판저널.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음글
- 최은미 장편소설 <마주>